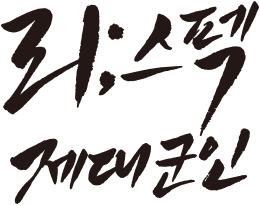Change Work
백 투더 잡
조선에서부터 2024년까지
옷 짓는 이들의 개성 있는 변천사
침선비 & 패션디자이너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옷. 60만 년 전 원시시대 사람들도 바느질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전해진다. 단순히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 신분의 구분과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까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옷 짓는 이들의 이모저모를 담아봤다.

사진 출처 ㈜쇼박스

사진 출처 ㈜와우픽쳐스

한 땀 한 땀 손끝에서 완성되는
침선비(針線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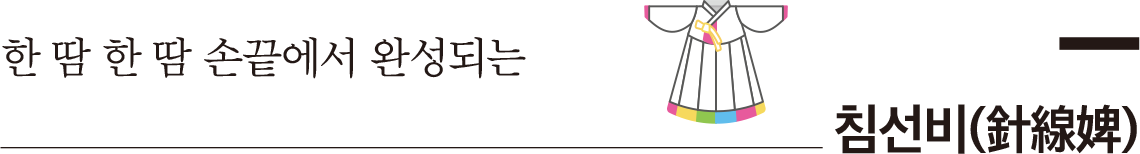
조선 후기 풍속화가 조영석의 작품 <바느질>에는 세 여인이 모여 앉아 바느질에 여념이 없다. 그림에서도 비춰지듯, 조선시대 여인들은 다른 사람의 바느질을 해주고 품값을 받는 삯바느질로 집안의 생계를 이끌었다. 관청에서는 침선비를 두고 바늘과 실을 전담하도록 했다. 침선비는 왕실의 의복을 전담하는 상의원 소속 노비인데 조선 시대 왕과 왕비의 화려한 옷은 이들이 만든 것이다. 상의원은 조선 태조 때 세워진 관청으로, 왕실에서 필요한 옷과 장신구 등의 수공예품을 만들어 진상하고 보관하던 곳이다. 경우에 따라 관원과 사신들에게 지급되는 물품도 공급하고 중국에서 보내온 관복을 보수하거나 직접 제조하기도 했다. 천민이라도 상의원에서만큼은 그 능력에 따라 벼슬길이 열리고 신분상승까지 가능했다고 하니 가히 꿈의 직장이라고 할 만하다.
창의적 영감과 개성을 말하다
패션디자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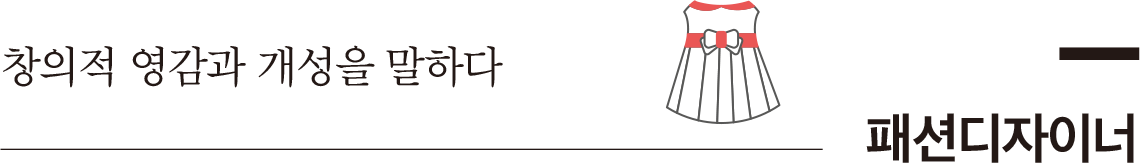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갖고 발전해 온 의복의 역사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에 방점을 찍는다. 조선시대 침선비가 특정 인물을 위한 바느질을 했다면 이제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개성과 트렌드가 의복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흔히 말하는 ‘솜씨’보다 예술시각적 능력과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요즘 패션디자이너의 주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 1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보면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이 들어있다. 이들의 혼이 담겨있어 ‘패션이 아니라 예술’이라 부르는 이유다. 4차 산업혁명 이후 기계와 로봇이 큰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다.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한다. 패션디자이너야말로 창의력과 예술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